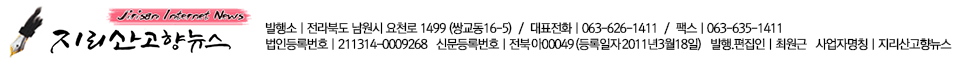논설고문.수필가 서 호 련
공자를 만나러 취푸(曲阜-곡부)에 갔더니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하네
다음의 글은 남원 서호련 주필(시민신문)의 특별기고 이다.
2회에 걸쳐 연재한다.
1)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니?
2) 서호련이 중국에서 만난 공자와 맹자
남원 투모로우 배급
위동페리는 3만 톤급이나 되고, 승선정원도 3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배였다. 오후 7시, 뱃고동을 울리며 새하얀 물살을 가르고 인천항을 출발한 배가 다음날 아침 10시에 청도(칭타오)항에 접안 했으니 장장 15시간이나 걸린 셈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독일인이 건설하여 식민지로 삼았다는, 동양속의 유럽, 칭타오의 언덕에 올라 아름다운 해안과 시내를 한참 내려다보고는 곧장 공자님을 만나러 옛 노나라 수도 곡부(취푸)로 향했다.
산동성은 끝에서 끝까지 5,000km나 되는 광활한 지역이다. 면적은 우리 남한의 1.5배이고 인구는 8천만 명이며 성도는 제남(지난)이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산동성은 공자, 맹자, 손자, 묵자, 장자, 동방삭, 제갈공명, 강태공 그리고 명필 왕휘지, 연청권의 창시자 수호전의 노준의 출생지라고 했다. 수호지의 실제무대인 양산박이 이곳 태산에서 1시간 40분 거리에 있단다. 의술의 성인 편작의 출생지이고, 서유기의 손오공이 살았다는 화과산도 산동성에 있다. ‘산동호한(山東好漢)'이라고 중국에서는 남자라면 산동사람을 최고로 친다고 한다. 조조가 서주성을 점령하고 왕업의 기틀을 잡았다는 그 서주시도 통과하였다.
우리가 가는 산동성은 우리 조상인 동이족 즉 고조선족, 부여족, 고구려, 백제, 신라유민들이 살던 근거지라고 한다. 산동성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고 음식도 기름에 볶아 국수에 얹어 먹는 음식인 장문화가 유독 산동성 에서만 발달 된 것으로 보아 우리 조상들의 후예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산동성은 동이족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전해오고 있고, 동이족은 산동성을 중심으로 요녕성, 하북성, 산서성, 섬서성, 안휘성, 호북성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대륙의 핵심지역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 특히 만주와 한반도에 퍼져 살고 있는 족속으로, 동이족은 동쪽에 있는 이(夷) 즉 큰 활(大弓)을 잘 쏘는 족속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한다.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 박사의 일화가 떠오른다. 한 번은 중국에 가서 중국의 세계적인 문호 린위탕(林語堂)을 만나,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놓아서 한국까지 문제가 많다.“ 고하자 ”그게 무슨 말이오? 한자는 당신네 동이족이 만든 문자인데 그것도 아직 모른단 말입니까?“ 하고 역습을 하더란다. 오래전 과거에 우리 민족이 중국대륙을 한때 장악 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지만 지금 그런 말 하면 그들이 미소 지을 것이다.
춘추전국시대 노(魯)나라 도성이었던 취푸(曲阜)는 산동성 성도 제남에서 남쪽으로 약 130k 떨어진 곳이다 인구 10만의 곡부현은 남원만한 곳인데 읍내가 온통 공자의 사당과
장원 그리고 묘역과 이에 관련된 문화시설들이었다.
유교는 2천5백여 년 전 공자가, 2300여 년 전에 맹자가 도를 세워 한나라 때 국가이념으로 채택된 뒤 오늘날 7천만 전 세계 화교들의 지도 원리일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18억 인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유교는 수 천 년 동안 우리문화와 정치, 학문, 사상, 이념의 근간이었다. 유교가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는 아닐지라도 기본생활윤리로서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속에 그 가르침이 스며있고, 특히 조상을 기리는 제사의식이어서 이미 종교화 되었다. 그러한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뵈려고 온 것이다.
공자의 유적은, 역대로 공자에게 제사를 지냈던 사당인 공자묘(廟), 그 동쪽으로 공자와 그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저택인 공부 (孔府), 그리고 공자와 그 가족묘소가 있는 공림(孔林)으로 되어 있다. 공묘는 웅장한 대성전을 중심으로 전체길이가 약 1Km, 면적은 22만 m2로서 전체건물의 방수가 466개에 달한다. 공묘의 본전 대성전을 받치고 있는 거대한 28개의 돌기둥, 그리고 정면 10개 기둥을 휘감고 올라간 두 마리의 용의 조각상은 탄성을 자아낼만 하다. 네 번째 정원에서 만나는 성시먼(城時門)에는 공자에게 제례를 지내는 대성전이 있고 그곳에는 안회(顔回), 자사(自思), 증삼(曾參), 맹자등을 함께 모시고 있다. 또한 공자가 살구나무 아래서 제자들을 가르친 곳을 기린 성싱탄(聖杏木)이 이채롭다.
이 공묘는 북경 황제들의 궁궐인 자금성과 태산의 대묘와 더불어 중국 3대 고 건축물에 들어간다. 특히 공묘는 중국에서 쯔친청(紫錦城) 다음으로 규모가 큰 역사적 건물이다. 466개의 방마다 한문으로 된 편액이 가득가득했는데 내 눈으로 보더라도 이 하나 하나가 천하의 명필인 것 같다. 그러나 구경하는 그 많은 관광객들도 다 그냥 사진만 찍고 지나는 것을 보니 그들 역시 나처럼 한문을 모르는 것 같다. 걸어서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 볼 수 없을 것 같은 경내다. 다음엔 공자의 묘소가 있는 공림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씨족 묘 이다. 공자와 공자의 후손 10만기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공림이라는 이름은 수많은 묘비가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한대(漢代)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비석은 송, 원, 명, 청을 거쳐 현재 3,600여개의 비석이 남아 있다. 중국은 죽으면 화장을 시키는데 이곳만큼은 예외다. 중국이 낳은 대성현에 대한 예우 일지도 모른다. 곡부는 공(孔) 씨가 90%다. 삼공(三孔) 이라고도 하는 이들 사적- 공묘, 공부, 공림 은 199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성현들이 계시지만 일개 읍 전체를 유적지로 만들어 그분들의 사상을 알리고 거대한 관광자원화 한 곳은 한국에는 없다.
이제 드디어 공자님을 뵈려 그집 대문 앞에 섰다. 사실 중국까지 와서 아시아의 대 성현을 배알한다는 것이 일생을 두고 쉬운 일은 아니다. 묘택 앞의 커다란 금빛 묘비에 대성지성문선왕묘(大成至聖文宣王墓)라고 쓰인 문패가 있는것이 문선왕이란 칭호를 받으신 모양이다. 옆에는 몇 백 년이나 되어 보이는 향나무가 집을 지키고 있을 뿐 왕의 칭호에 비해서는 그리 화려한 묘소는 아니다. 우리나라 어느 갑부의 선산만도 못했다. 대성인의 집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밖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진을 찍고 왁자지껄 하는데 공자님은 아무 기척이 없으시다. 공자를 만나러 곡부까지 왔건만 그분은 잠만 자고 계신다. 공자묘 옆에는 공자 아들의 묘소가, 그 앞쪽엔 공자의 학문을 계승한 손자, 자사(自思)의 묘소가 있다. 하지만 모두가 조용히 잠들어 계신다. 밖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욕의 역사를 공자는 알고 있을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모택동의 문화혁명 때는 홍위병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지식인들이 수난을 당했다. 권력자의 발목을 잡거나 혁명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1966년 11월,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의 와중에서 북경사범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로 구성된 200여명의 문화혁명소조는 이곳에 몰려와 6천여 점의 공자유물을 파괴하였다. 이들이 토공대회(討孔大會)를 열었을 때 무려 10만 여명이 동원되었다. 공림 또한 파괴되어 공자무덤이 파 헤쳐져 무덤은 평평하게 되었고 묘비는 훼손되었다. 모택동은 자기의 후계자였다가 배신자가 되어 죽은 린뱌오(林彪)와 봉건주의 대표로 지목된 공자를 함께 타도하자는 비림비공(批林批孔)운동을 벌리면서 유교를 동양사회를 낙후시킨 봉건적 사상으로 간주, 공자와 주자사상을 철저히 훼손하였다. 공자는 봉건지배 계급의 주구로 취급 받았다. 그리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외쳤다.
중국이 낳은 세기의 대문호이며 현대중국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쉰(魯迅)은 그의 광인일기(狂人日記)에서 “공자는 5천년 중국을 억누른 파괴의 대상이다. 허위의 우상을 파괴하라.”고 질타했고 중국문학혁명의 주체였던 오위(吳위 )는 신청년(新靑年)에서 “공자는 봉건적 누습의 근원이다. 그는 권세 있는 지식인들이 관리로 출세하는 수단 일 뿐, 공자는 통치를 받는 일반대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 공자의 사적지에 년 간 천만 명이 다녀가고 있으니 공자는 아직도 중국인민의 가슴속에 살아 있다는 것인가? 박물관 속에 안치되어 있는 공자를 보러들 온다는 것인가?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